전문가 칼럼
낡은 건물을 살리는 기술이 도시를 바꾼다[김현아의 시티라이프]
- [기술에서 전략으로]①
왜 ‘부수는 도시’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대안으로 떠오른 ‘리트로핏’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전 국회의원]우리는 지금 고령 인구만큼이나 노후한 건물과 기반시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화와 고도성장기에 우리 사회는 오래된 건물을 보면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겼다.
특히 주거 부문에서는 노후하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떠올렸고, 이는 돈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 관리의 공식’처럼 작동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나 각종 규제 때문만이 아니다. 억 단위로 치솟은 공사비 때문만도 아니다.
탄소배출 억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제적 규범이며, 건축물의 신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적탄소(Embodied Carbon)는 이미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면서 골치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21)’에서 “신축 중심의 건축산업 구조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각 도시들은 새로 짓는 건축보다 기존의 낡은 건물의 처리가 더 골치가 아프다. 오래된 공용공간과 산업유산의 노후화가 누적되면서, 관리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보다 ‘역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Adaptive Reuse (한국어로는 ‘적응형 재사용’으로 통용)이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이 리트로핏(Retrofit)이다.
리트로핏은 어떻게 도시전략이 됐는가
리트로핏은 1970~80년대 노후 산업시설 개조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초기에는 설비 교체·보강을 통한 수명연장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 생태자원 활용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결합되면서 이제는 기존 공간의 기능뿐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재설계하는 도시전략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고단열 창호와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탄소감축형 리트로핏, 3D 스캐닝 및 BIM 설계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합형 리트로핏, 생태소재를 기반으로 한 생태순환형 리트로핏까지 등장하면서 ‘리트로핏 = 미래도시 기술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각 국가의 정책 수준에서도 공식화되고 있다. EU는 2020년부터 ‘Renovation Wave Initiative’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비율을 연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있으며, 미국 정부(GSA) 또한 ‘Historic Building Reuse Program’을 통해 공공시설에 리트로핏 우선 적용 의무제를 도입했다. 선진 도시들은 이미 ‘신축 중심의 프레임에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이를 도시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디트로이트의 미시간 중앙역은 1910년대 자동차산업의 전성기를 상징하던 공간이었지만 1988년 폐쇄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채 황폐화돼 있었다. 전환의 전기는 2018년 포드(Ford)가 이 역사를 매입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복원 방향은 단순한 ‘산업유산 보존’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한 도시거점 조성’에 있었다. 외관은 원형을 유지한 채 내부를 스타트업 오피스와 연구소, 고용훈련센터 등으로 재구성했으며, 기존 철골 구조에는 탄소섬유(FRP) 보강을 적용했다. 대형 천창에는 고단열 투명패널을 설치하고 전체 설계는 BIM 기반으로 진행해 역사성과 첨단 기술의 공존을 구현했다.
프랑스 아를(Arles)의 루마 아를(LUMA Arles)은 기존의 19세기 철도정비단지를 예술·MICE 복합 캠퍼스로 전환한 사례다. 산업쇠퇴 이후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이 부지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철거’가 아닌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고, 기존 석조 공장동은 3D 스캐닝과 디지털트윈 모델링을 통해 보존 구역과 개조 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했다.
이후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신축 타워를 기존 동선을 기반으로 입체적으로 삽입하고, 내부 마감에는 해조류 단열판과 소금벽체 등 지역 생태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산업유산 위에 문화·생태 가치를 덧입힌 전환 전략을 실현했다.
캐나다 토론토의 아트스케이프 위치우드 반즈((Artscape Wychwood Barns)는 기존 노면전차 차고를 지역 문화 및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건물 외벽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붕을 개방하여 반(半)옥외형 공공광장을 조성하고, 실내에는 예술가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키친, 도시정원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했다. 동시에 태양열 온수설비와 빗물재활용 시스템, HVAC 리트로핏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 공간은 현재 토론토 시민들의 일상이 모이는 대표적인 지역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리트로핏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우선 전략’이다
리트로핏은 더 이상 ‘건물 수리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전략적 언어다. 실제로 신축 대비 탄소배출은 평균 40~50% 줄고 공시간은 25~30% 단축되며, 지역 고용 및 창업 생태계 유입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려는 시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노후 건축물과 공간을 여전히 ‘주택’ 중심 혹은 ‘경제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휴 산업단지, 항만부지, 공공 기반시설 등 잠재된 도시 자산을 어떤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일부 도시재생 사업에서 적응형 재사용이나 리트로핏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간주될 뿐 정책의 중심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소극적 대안’이 아니라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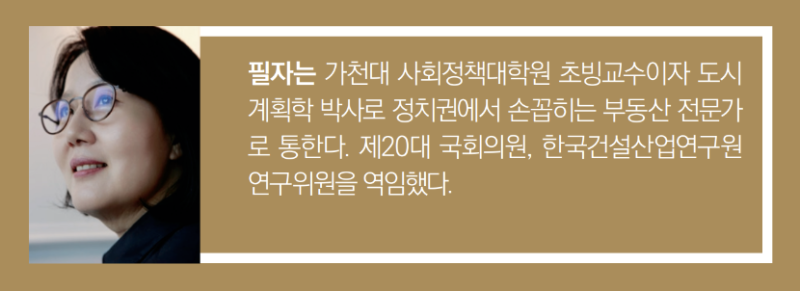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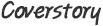







![‘채널주인부재중’으로 본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7/isp20250727000081.400.0.jpg)
![마지막에 한방이 있다 ‘흑백리뷰’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06/isp20250706000027.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다시 주목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린·이수, 11년 만에 이혼…"절차 마무리 중"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다시 주목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세금 0원에 150억 환차익 ‘잭팟’…유럽 빌딩 투자했더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압타바이오, 급성신손상 예방약 내년 기술이전 자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